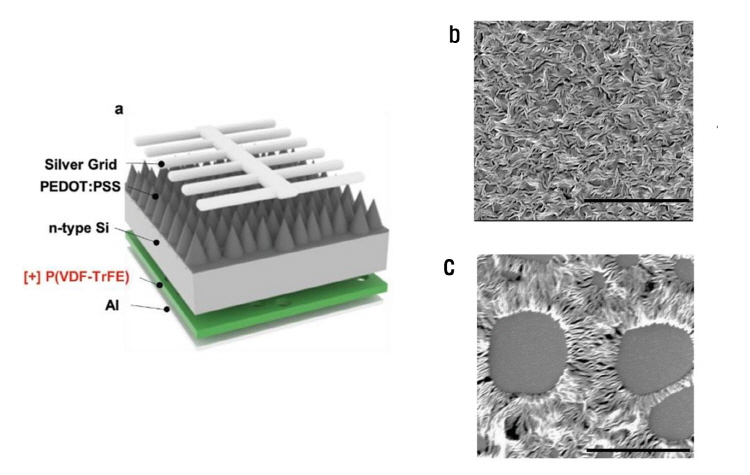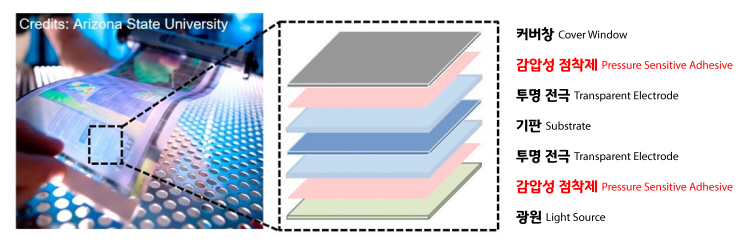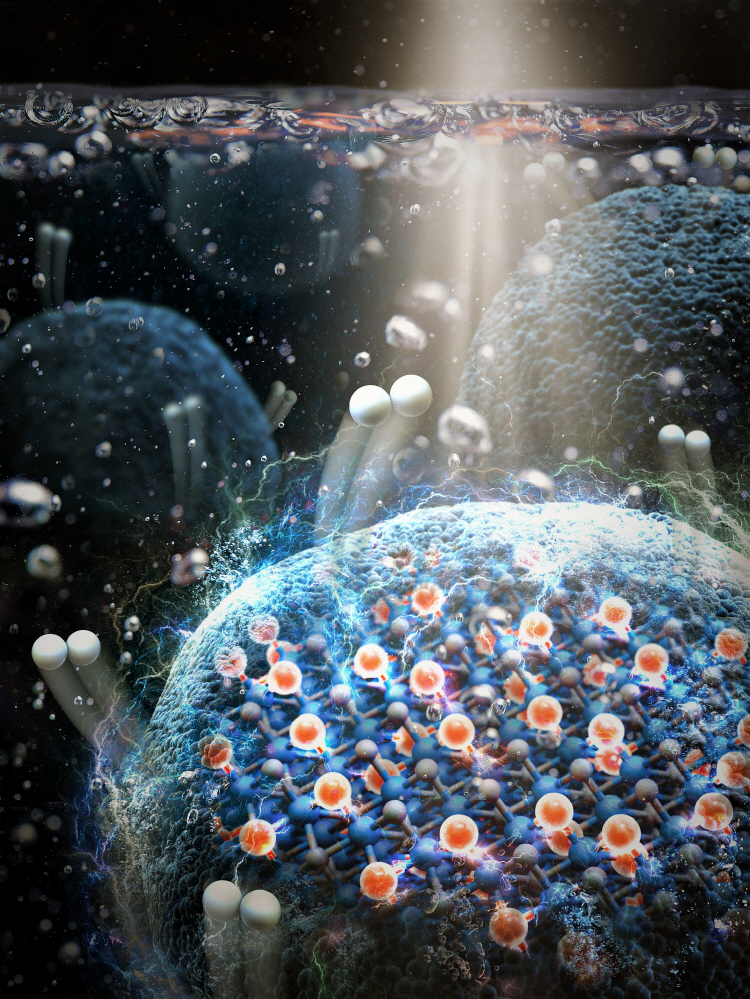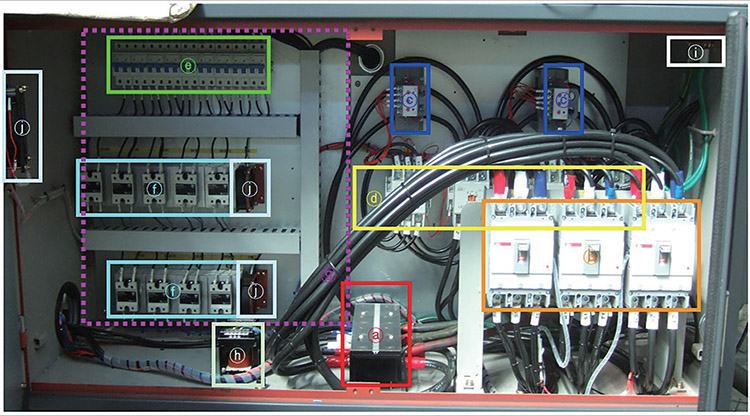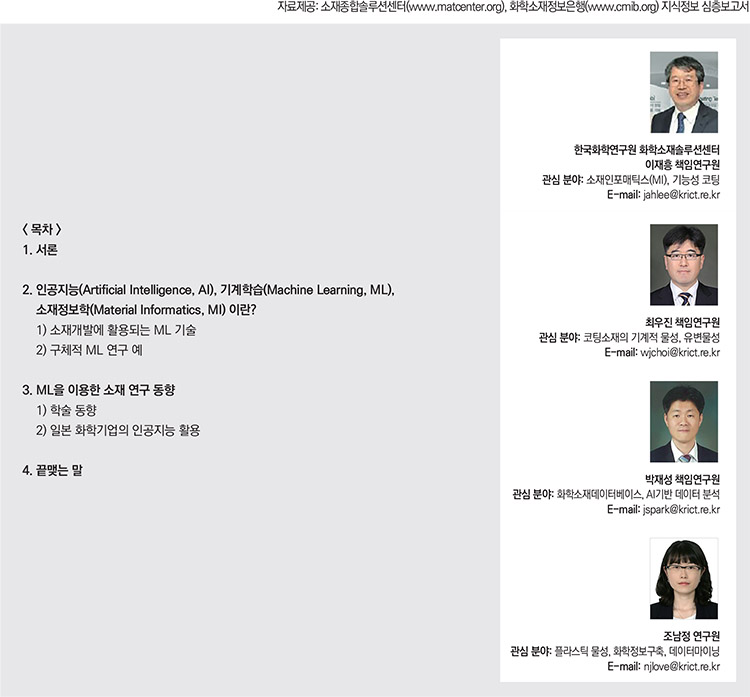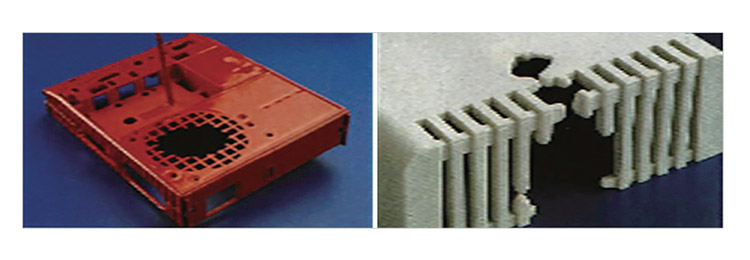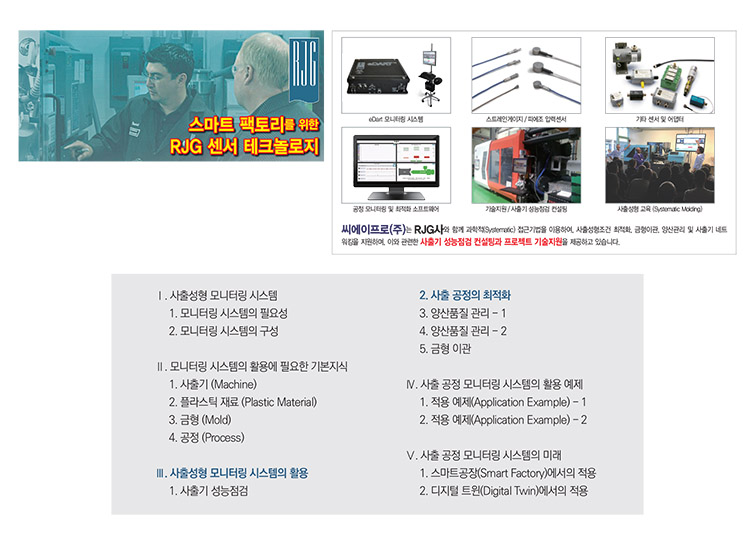뉴스 News
기술과 솔루션
news
기술과 솔루션
취재부
2020-10-11
편집부
2020-10-11
편집부
2020-10-11
편집부
2020-10-11
편집부
2020-10-05
편집부
2020-10-05
취재부
20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