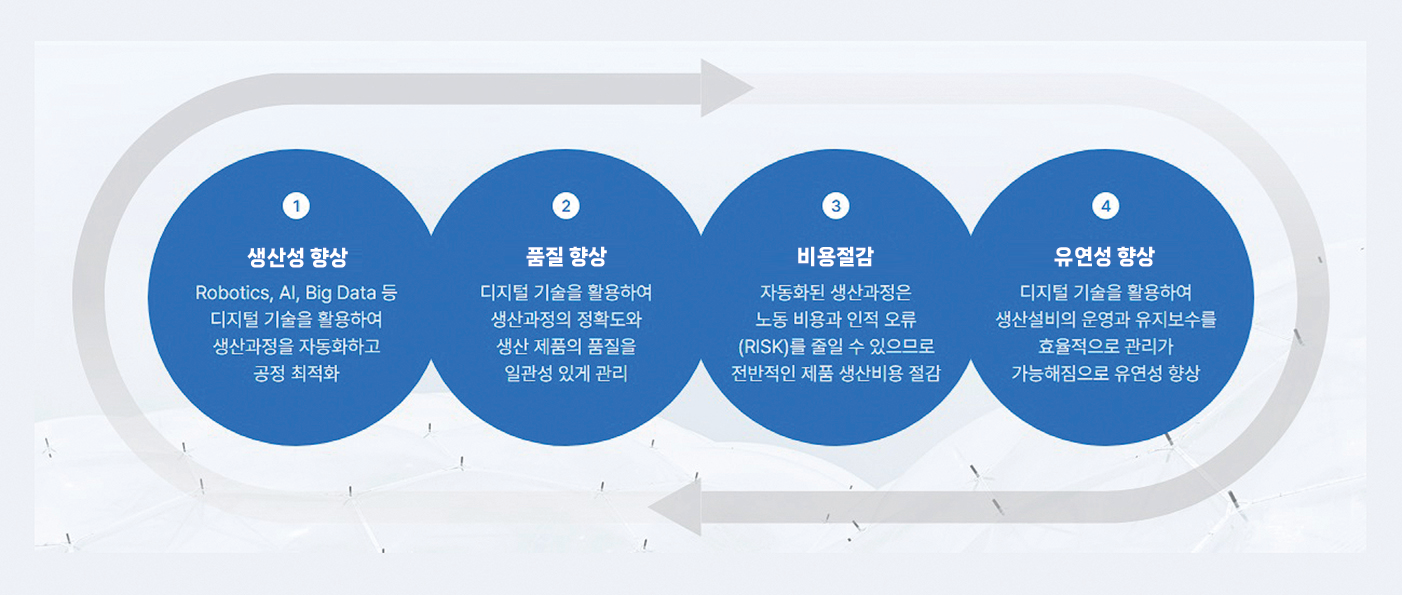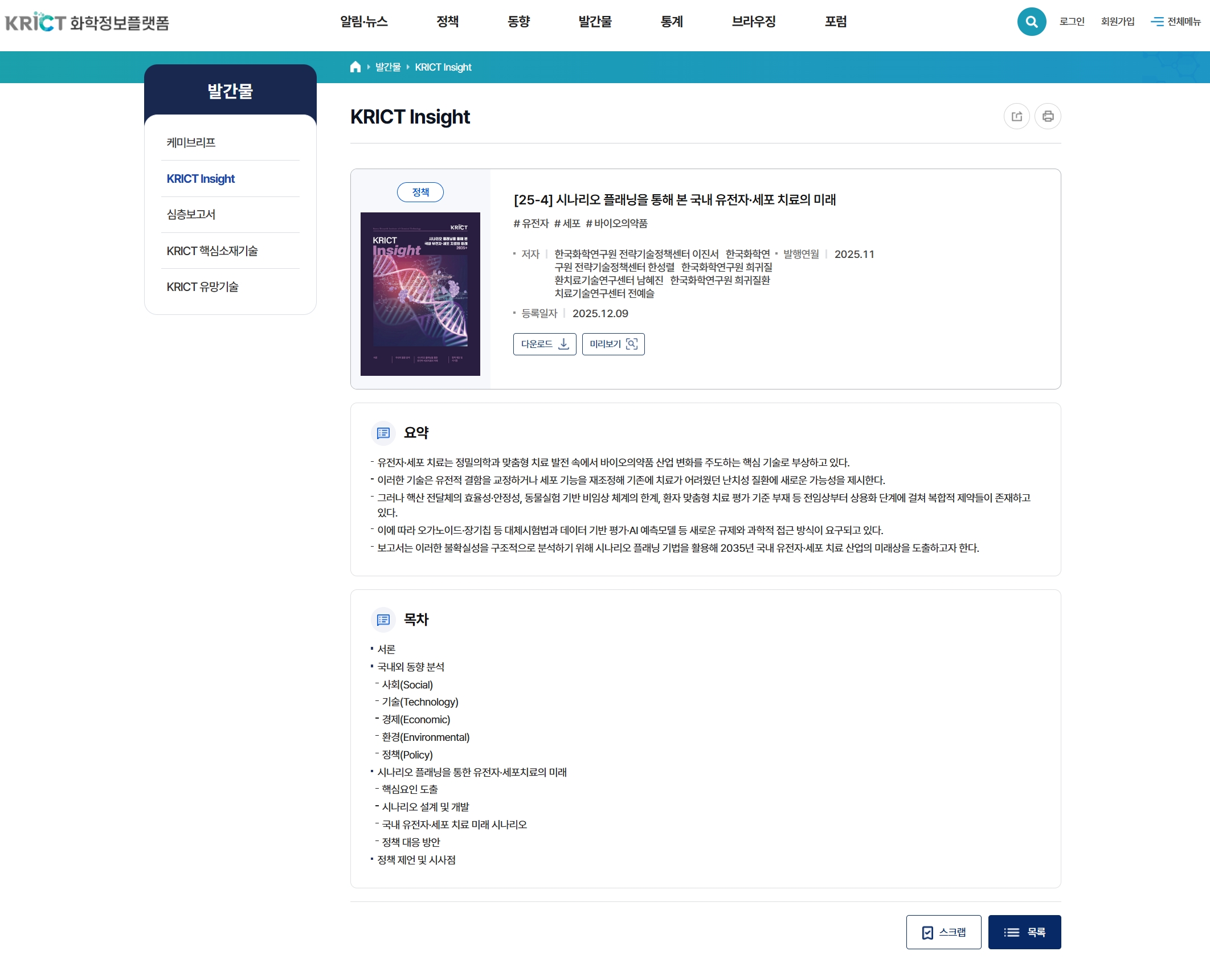캐미칼리포트
세종대 미래화학소재연구소, K-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학연 포럼 개최
-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지난 8월 6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열려
세종대학교 미래화학소재연구소는 지난 8월 6일,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K-화학산업의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R&D 활성화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 K-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산·학·연 협력 기반의 R&D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 정책·기술·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동시에 미래 인재 양성과 글로벌 전략 등의 주제가 폭넓게 논의되었다.

본 행사는 세종대학교 미래화학소재연구소 이원목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 소장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세종대학교 엄종화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대가 과거 인문·예체능 중심 대학에서 이공계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 온 배경을 소개하며, 이번 포럼이 한국 화학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공동주관기관인 한국화학산업협회 엄찬왕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석유화학 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R&D와 산학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업계의 공감대’를 전했다. 더불어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 김종량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등 글로벌 전환 환경 속에서 산학연이 함께 기술 혁신과 정책 대응 플랫폼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윤천 학장은 ‘화학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포럼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송인협 PD는 정부 R&D 기획 담당자로서,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 김용석 세종대 화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R&D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양순정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 사무국장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AI·플라스틱 공정 기반 전문 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전문단체의 역할을 제안했다. 최우진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은 공공 데이터 인프라의 안전한 개방과 민간 활용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도훈 한화토탈에너지스 전무는 시장 중심의 제품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다. 박희광 LG화학 박사는 산학연 간 기술개발과 제품화의 역할 분담 필요성을, 이분열 아주대 교수는 국내 주도 공정 개발의 중요성을, 김용진 단국대 교수는 새로운 정책 아젠다 설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인협 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는 고부가·친환경 화학 소재 중심의 R&D 기획 방향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계 현실과 정책, 기술 개발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화학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포럼은 산·학·연 및 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K-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R&D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